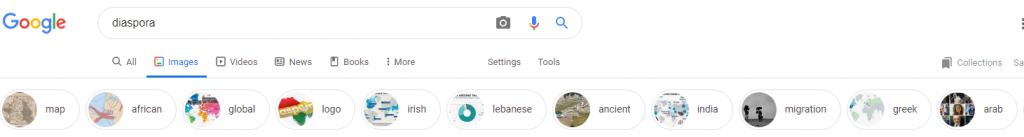미국 사회에서 아시안에 대한 인종혐오가 코로나를 계기로 불붙고 있다.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마사지 스파숍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을 둔 싱글맘이 있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아들이 인스타그램에 남겨놓은 글을 잠시 읽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이혼 후, 두 아들을 데리고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억척같이 살았을 그녀의 삶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착잡하기 그지없다.
사실 한국에선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종 혐오와 갈등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소수민이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떠나온 모국이 가난해서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더러운 기분을 느낄 순 없다.
한국사회가 인종 차별에 무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타인종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인터넷에는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취업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난무하다. 온라인에 숨어 비열하고 허접한 말들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직접 겪어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러게 누가 고국 버리고 미국 가서 살라고 했나? 이런 말들을 던지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는 어찌 됐건 해외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인 사회에서부터 시작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 요즘, 1980년대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 ‘미나리’는 내게 착잡하고 쓸쓸한 오묘한 감정들을 갖게 했다. 나 역시 1981년에 미국 이민을 갔던 큰 언니를 시작으로 우리 집안의 이민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미나리’를 보면서 저 세상으로 일찍 떠난 큰 언니 생각이 참 많이 났다.
영화 ‘미나리’는 하루 종일 병아리 ‘똥구멍’을 쳐다봐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새로운 꿈을 위해 척박한 땅 아칸소주로 이주하는 제이콥(스티브 연)과 모니카(한예리) 가족의 이야기다. 제이콥은 한국 야채를 재배하는 농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해 이민을 왔는데 현실은 가족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노동에 시달린다. 그게 현실이다.
제이콥은 농장도 일궈야 하고 생활비와 농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아리 감별사를 그만둘 수 없다. 낮에는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고 퇴근 후, 주말에는 땅을 갈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의 일꾼으로 지낸다. 이렇게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 제이콥은 몸에 무리가 오고 감별하기 위해 병아리를 운반하는 박스를 떨어뜨려 감별도 못해보고 소각장으로 실려가게 하는 실수를 자꾸 저지른다.
애초 한 곳을 바라보며 이곳 미국까지 왔지만 어느새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팽팽하게 평행을 이루게 되는 제이콥과 모니카. 아이들도 돌볼 겸 혼자 한국에 사는 친정 엄마를 모셔 오기로 타협하며 이들 부부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친정 엄마, 순자(윤여정 분)는 더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순자’는 예사 할머니 같지 않다. 손녀딸과 손자에게 화투를 가르쳐 같이 치고 TV에서 중계하는 레슬링에 꽂혀 옷을 꺼내 달라는 데이빗에게 직접 꺼내 입으라며 귀찮아한다. 데이빗은 무거운 서랍을 열다 서랍이 떨어져 발등에 상처를 입는다. 특히 데이빗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이런 할머니가 못마땅하다. 힘든데 자꾸 멀리 걸어서 냇가에 가자고 하고 심지어는 뛰라고도 한다. 데이빗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오줌을 음료로 마시게 하는 등 못마땅한 할머니를 놀려먹는다.
순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고춧가루에 멸치에 한약 등등 한국 식료품을 갖고 오면서 미나리 씨앗을 갖고 들어온다. 아픈 데이빗을 앞세워 걸어서는 기어코 먼 냇가까지 가서 여기에 미나리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는 데이빗과 자주 찾아와 미나리가 자라는 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본다. 놀랍게도 데이빗은 할머니와 들판과 냇가를 돌아다니며 앓고 있던 심장병이 차츰 좋아지게 된다.
데이빗이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데이빗은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려 할머니 품을 파고 들어가 간신히 잠에 든다. 할머니 순자는 데이빗 대신, 악령에 맞서 싸우다 악령이 씌운 것처럼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에 이르게 된다.
순자는 천신만고 끝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반신불수가 된 몸을 이끌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아들 데이빗의 정기 검진을 위해 도시 병원으로 떠나는데 제이콥은 아들 진료도 진료지만 한국 야채 판로 확보를 위해 재배한 농작물을 샘플로 챙기며 애지중지한다.
도시로 떠난 딸과 사위 가족에게 뭐든 도움이 되기 위해 순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를 한다. 청소 후, 쓰레기를 태우다 바람에 불씨가 날려 농장 창고에 불길이 순식간에 붙어버린다. 엄청난 사태 앞에 정신줄을 놔버린 순자는 절룩거리는 발길로 사라지려고 한다. 이를 본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붙잡으며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불길이 잡힌 새벽,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망연자실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고 뒤를 이어 냇가를 완전히 뒤덮은 미나리 수풀 속에서 미나리를 수확하는 제이콥과 데이빗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난다. 제이콥의 가족은 아칸소에 한국 야채 재배 농장을 일궈낸 것일까? 아닐까? 결말이 다소 불분명한 것이 아쉽다.
저예산 영화로 제작돼 선댄스를 비롯, 미국의 저명한 영화제와 협회에서 수여하는 상들을 타고 있는 ‘미나리’의 쾌거는 이 작품을 만든 정이삭 감독의 공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제이콥 역을 맡은 스티븐 연의 인터뷰를 보고는 그간 한국계 배우들의 활동이 자양분이 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티븐 연은 인터뷰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작자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밝혔다. 브래드 피트가 이끌고 있는 제작사 플랜B의 제작 투자도 아마 스티븐 연의 네트워크와 이름값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미나리’는 한국에서 3월 3일 개봉된 후,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좌석 여기저기서 나오는 낭패 섞인 한숨 소리를 듣게 된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럴 법도 하다. 이 영화는 이민자가 아니면 그 페이소스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영화다.
고향을 떠나 전 세계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무엇일까? 본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 ‘디아스포라’.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돼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혹은 공동체 의식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19년.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 비교적 많은 고민을 해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약 2년여를 지내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영화 ‘미나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가족’-한국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