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위한 회계법인을 2곳 선정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각각 1곳씩을 정한다.
두 주체가 따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이유는 추가 자금지원과 관련이 깊다. 자금부족 원인이 불분명하면 주채권단과 PF대주단은 일단 절반씩 지원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한다. 그런데 이 사후정산 부담 비율을 사실상 회계법인이 결정한다. 정당한 부담이 되도록 두 회계법인이 채권 주체들의 논리·법리 대리전을 해야 하는 셈이다.
16일 2014년 개정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 개선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主) 회계법인과 부(副) 회계법인 등 2개의 별도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계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지침은 “주 회계법인은 주채권은행이 선정하고 부 회계법인은 PF대주단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선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한 곳은 산업은행이 결정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PF대주단을 대표하는 곳으로 구성하라는 뜻이다.
실사 범위도 기술돼 있다. 주 회계법인은 건설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부 회계법인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세부적인 방법 등도 두 법인이 협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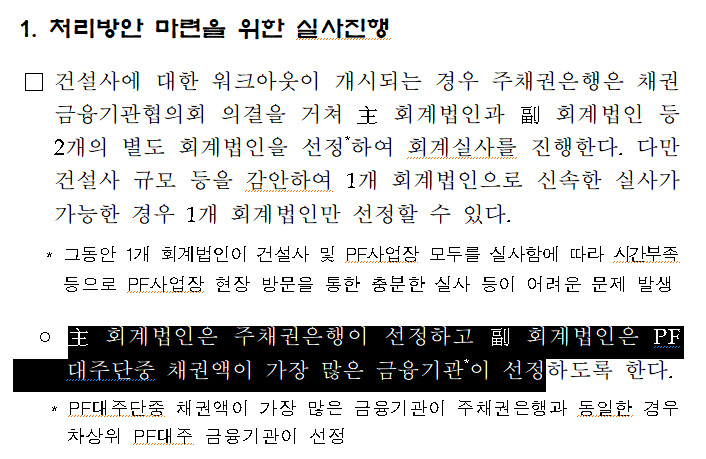
주채권단과 PF대주단이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자금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자금보다 PF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통상 더 크다. 그렇기에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풍림산업과 우림산업은 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과 대주단 간 이견 등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호산업도 주채권단과 대주단 사이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었다.
지침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부담해야 한다. 자금 부족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사후정산 부담 비율을 회계법인이 사실상 결정한다. 주채권자와 PF대주단이 공동으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이견조율 장치로 작동하지만, 이는 주채권자와 PF대주단이 동수로 구성된다. 첨예한 대립 상황에선 정치력이 마비될 수 있다.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회계법인 실사 등을 통해 부족원인을 규명하고 확정된 바에 따라 우선 지원금액을 사후 정산키로 한다”고 표현했다. 하나의 회계법인이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되면 각 주체에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두 채권단이 합의하면 하나의 회계법인으로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해진다. 회계법인 결정에 따라 이견 없이 자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두 곳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두 곳을 각각 선정해 진행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