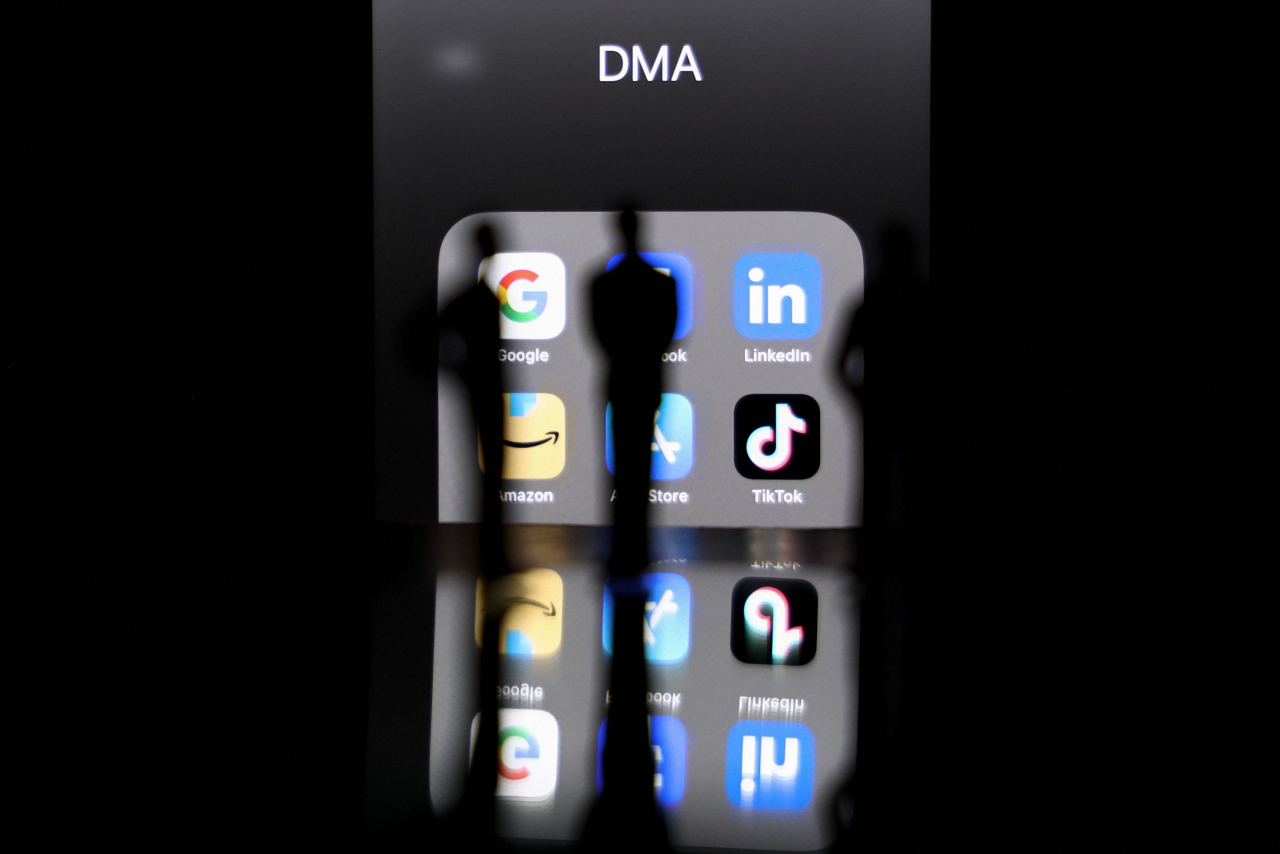 |
| 아이폰에 비춰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발표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AFP]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거대정보통신 기업)의 독점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본격화되자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6일 도입하는 가운데 애플은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결제 수단도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 역시 유럽에서의 검색 사업 관행을 대대적으로 변경, 검색 결과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를 더 명시적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안은 서비스를 경쟁 업체에 개방하는 것은 물론 획득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매출의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EU 경쟁 당국은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글 역시 지난달 28일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를 비롯한 32개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21억유로(약 3조34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미디어 그룹들은 디지털 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봤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애플이 애플리케이션마켓 ‘앱스토어’의 정책을 유럽연합, 한국, 미국 등의 규제에 맞춰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유럽의회는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에서 판매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카메라의 충전 단자 표준을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끝 모양이 일자인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고수해온 애플은 유럽에선 추전 단자를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선 지난 2021년 9월 중순부터 인앱결제 방지법을 시행됐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이 같은 법안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애플과 구글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예정돼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NYT는 “그동안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기술 기업들은 규제 없이 사업을 확장해갔다”면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한국, 호주에서 규제와 법적 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억제하기 위한 전환점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옥스퍼드대의 그렉 테일러 교수는 “은행, 자동차, 건강관리까지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법률과 규제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하고 있다”며 “EU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같은 기조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규제들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공룡 기업들에 대대적인 효과를 즉각 거두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시장법 제정을 도운 안드레아스 슈왑 유럽의회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들에 대해 “1년 안에 법안들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