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표현 두고 시민단체·업계 모두 반발
업계 “까다로운 규제보다 불명확한 규제가 더 나빠”
 |
| 지난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안 내 명시된 ‘고영향 AI’ 용어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AI 위험성을 축소한 모호한 용어로, 그마저도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내 명시된 ‘고영향 AI’라는 단어에 대해 시민단체·업계 모두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당시 AI 기본법에 명시된 ‘고위험 AI’를 ‘고영향 AI’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어내고, 산업 중요성을 부각하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다. 여야당 모두 이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고영향 AI’라는 표현이 최종 채택됐다.
 |
| 지난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
문제는 ‘고영향 AI’의 범위와 규제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할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영향’이 AI 위험을 축소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향 AI’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조항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AI’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AI 개발 및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해당 단어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와 규제는 오히려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AI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니, 기업에서 내놓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라며 “AI 모델 종류·규모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돼야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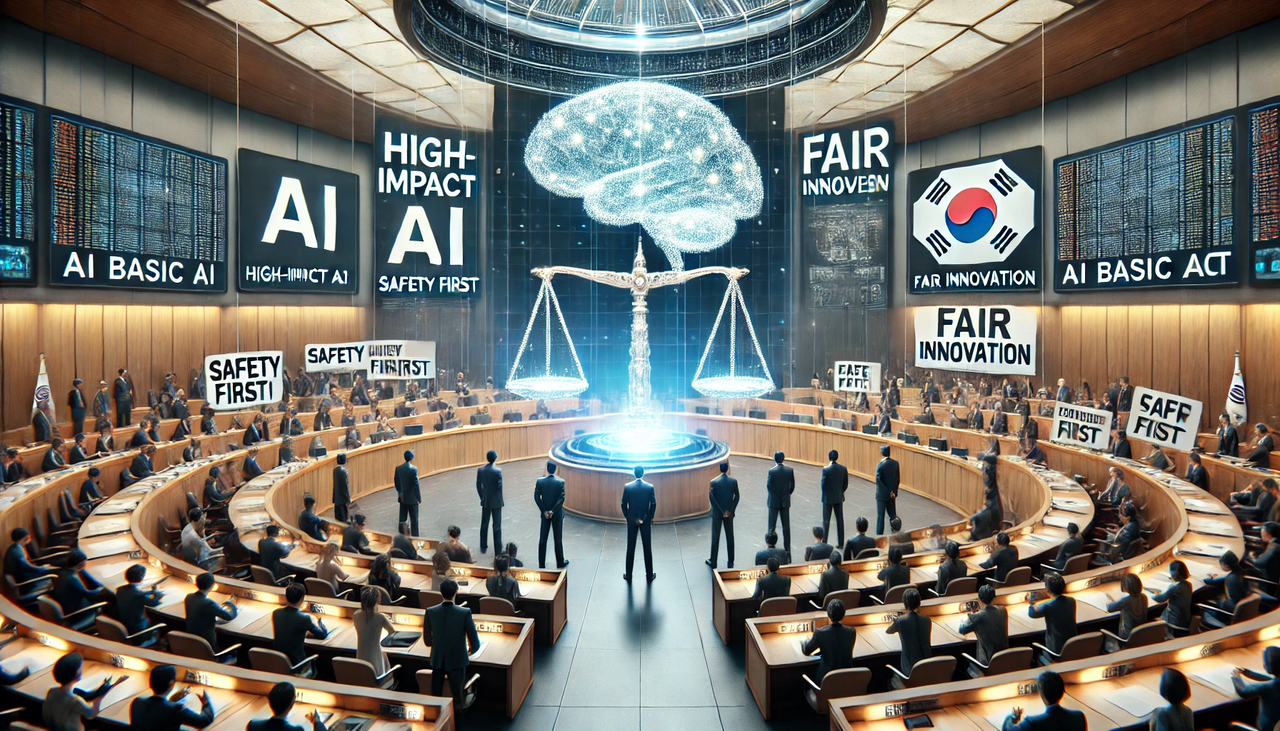 |
| 챗GPT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 [챗GPT 제작] |
더 나아가 ‘AI 기본법’ 자체가 설익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정부가 AI기본법으로서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법안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영향 AI’라는 단어를 도입한 취지는 좋지만, 규제 내용이 불명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AI산업이 싹트고 있는 시기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법안 도입 초기부터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까다로운 규제보다 불명확한 규제가 더욱 좋지 않다”라며 “규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조차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라면, 그 부담은 모두 사업자가 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