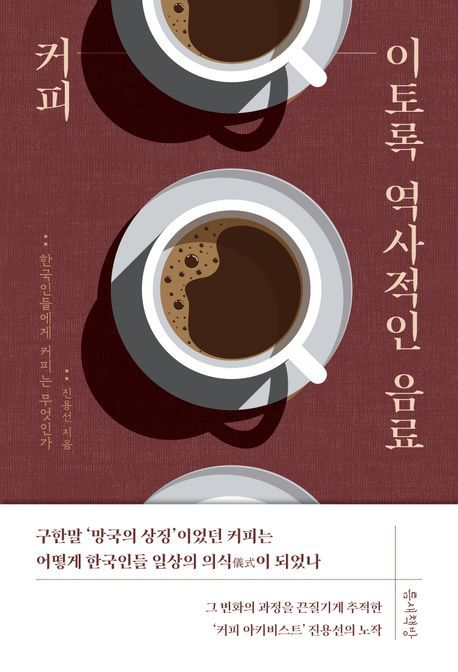 |
| 커피 이토록 역사적인 음료 / 진용선 지음 / 틈새책방 |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원 버스에 내 몸을 싣고….”(god ‘보통날’)
아침을 여는 ‘리츄얼(ritual·의식)’이 곧 ‘커피’가 되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2.6배에 이른다. 그 뿐인가. 밥값보다 비싼 커피가 꽤나 많아졌지만, 소비자 저항도 거의 없는 편이다.
등단 시인이자 커피 아키비스트(archivist)인 저자는 신간 ‘커피, 이토록 역사적인 음료’(한국인에게 커피는 무엇인가)를 통해 140년에 걸친 한국 커피 문화사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커피콩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커피 종주국이 되고, 수출입 항구가 없는 강릉이 커피 도시가 된 데에는 분명 문화적 맥락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저자는 이제는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어 미안할 정도인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난히 경쟁심리가 거센 한국 사회가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안목 해변에서 커피를 든 이들 중 대다수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자신의 SNS에 ‘#강릉’, ‘#안목커피’라는 문구와 함께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될수록 여기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다.”
그렇지만 강릉에서 800곳이 넘는 카페가 성업하는 것이 오직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리는 없다. 초당옥수수 커피, 흑임자 라떼 등 분명 특색있고 맛은 보장된 커피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강릉에 카페거리가 생기기까지 커피는 구한말 고종을 비롯해 최상류층만 먹을 수 있었던 ‘가배()’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문인들이 다방에 모여 문학과 시국을 의논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하고, 모던걸·모던보이의 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 보급물자 중 하나였던 달디 단 믹스커피로 ‘위로’의 맛이 됐고, 이제는 겨울에도 꼭 마셔줘야 하는 ‘검은 숭늉물-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며 그 자체로 역사가 됐다.
이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