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빌 비올라(1951~2024)의 ‘Moving Stillness(움직이는 고요): 마운트 레이니어 1979′(1979). [국제갤러리]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전시장. 공중에 떠 있는 스크린에서 소복한 하얀 눈 품은 산이 장엄한 자태를 드러낸다.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해발 4400m의 미국 워싱턴 주의 레이니어 산이다. 그런데 덧없이 일렁인다. 곧추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웅장한 산이 변화무쌍하게 출렁이다니. 당최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두 눈에 담긴 눈앞의 산은 분명 흔들리고 있다.
사실 산이 요동치는 건 스크린 바로 아래 있는 물웅덩이가 이미지를 반사해서다. 손으로 물을 휘휘 저으면 표면의 파동에 따라 산도 물결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넘실대던 파동이 잔잔해지면 산도 고요하게 정지한다. 동요하는 건 산이 아니라 산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라는 듯, 작가는 저마다 불안정한 내면 그 밑바닥으로 관람객을 이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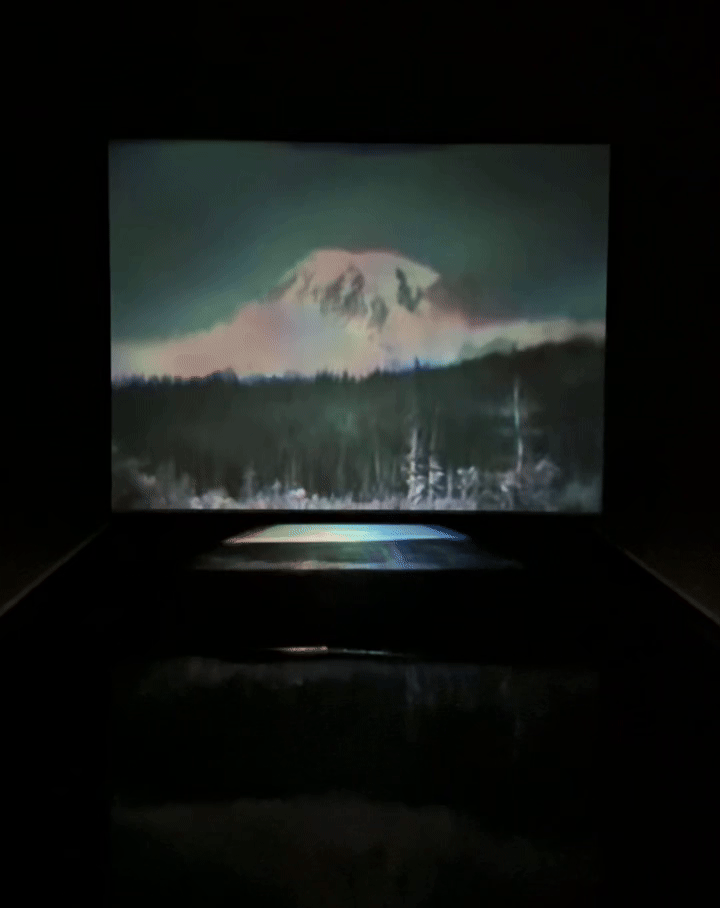 |
| 빌 비올라(1951~2024)의 ‘Moving Stillness(움직이는 고요): 마운트 레이니어 1979′(1979). 이정아 기자. |
이 작품은 지난해 7월 유명을 달리한 빌 비올라(1951~2024)의 ‘Moving Stillness(움직이는 고요): 마운트 레이니어 1979′. 오는 26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그의 개인전 하이라이트 작이다. ‘비디오아트의 렘브란트’이자 ‘백남준 조수’로 한국에 잘 알려진 비올라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시간을 조각하는 철학자다. “나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살아생전 그가 남긴 말이 작품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장 이 작품만 해도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존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깊게 연결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은 부정적 감정이 아니다. 그의 관점에서 불안은 우리가 당연시하며 매달려왔던 가치가 일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이 때문에 불안은 인간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를 직면하게 만드는 통찰이다. 비올라의 일렁이다 잠잠해지며 다시 요동치는 산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나 결국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은, 관람객마다 그간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반추하게 만드는 불안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나 자신을 꿰뚫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인 셈이다.
 |
| 이강소의 ‘무제-7522’(1975/2018 재제작). 이정아 기자. |
일상의 안주를 깨뜨리고 자신의 마음과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 전시된 곳은 더 있다. 오는 4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강소 개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 ‘무제-7522’다. 전시장에는 두 개의 돌이 놓여 있다. 하나는 눈앞에 존재하나 깨진 돌, 다른 하나는 흑백 사진 속 깨지기 전의 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돌이 아니다. 같은 돌을 보거나 떠올리면서도 사람마다 기억이나 경험에 따라 돌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돌은 각자에게 다른 존재다. 달리 말하면 돌이 가진 본래 의미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존재가 해석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난다는 하이데거의 철학과 다시한번 연결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물인 돌조차 깨지고 닳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듯 불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 나아가 자기만의 돌은 곧 자신만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비올라와 이강소의 각 작품 앞에서 무한히 뻗게 되는 질문은 흡사하다. 정지해 있는 산(깨지기 전의 돌)이 과거이고 일렁이는 산(깨진 돌)이 현재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나. 내가 흔들리는 산(깨진 돌)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불안인가. 나는 불안을 회피하나, 마주하나. 나는 내가 잊었거나 외면하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릴 준비가 돼 있나.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무엇인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지나간 해는 어떠했고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음미하고 성찰하기 좋은 전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