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빳빳하게 다림질 되진 않았지만 생활인의 티가 역력히 묻어나는 셔츠의 소매는 늘 한 번 접어 느슨하게 걷어올렸다. 셔츠 주머니엔 펜 두 자루가 꽂혀있었다. 자주 꺼내쓸 일 없는 만년필은 중요한 결제 서류에 싸인하기 위한 용도였고, 다른 한 자루는 어느 상황에서나 꺼내써야할 검은 볼펜이었다. 오래된 벨트를 채운 ‘적당한’ 사이즈의 바지를 입었다. 1970년식 세이코 시계는 1만5000원에 주고 구입했다. 젊은 시간을 함께 보낸 시계를 팔러나온 할아버지에게 구입했다는 시계의 뒷면엔 ‘전략기획실’이라고 적혀있었다. 배우 김대명이 완성한 ‘김 대리’였다.
빳빳하게 다림질 되진 않았지만 생활인의 티가 역력히 묻어나는 셔츠의 소매는 늘 한 번 접어 느슨하게 걷어올렸다. 셔츠 주머니엔 펜 두 자루가 꽂혀있었다. 자주 꺼내쓸 일 없는 만년필은 중요한 결제 서류에 싸인하기 위한 용도였고, 다른 한 자루는 어느 상황에서나 꺼내써야할 검은 볼펜이었다. 오래된 벨트를 채운 ‘적당한’ 사이즈의 바지를 입었다. 1970년식 세이코 시계는 1만5000원에 주고 구입했다. 젊은 시간을 함께 보낸 시계를 팔러나온 할아버지에게 구입했다는 시계의 뒷면엔 ‘전략기획실’이라고 적혀있었다. 배우 김대명이 완성한 ‘김 대리’였다.
“직장인이 되고 4년차에 대리를 달아요. 대리가 되고 2~3년이 지나 7년차가 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편한지 몸으로 알게되는 때더라고요. 그런 생활감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원작의 캐릭터를 반영해 외형적인 설정을 많이 따랐다지만 김대명이 만든 ‘김 대리’는 그가 말문을 열기 전까진 다분히 ‘만화적’이었다. ‘아줌마 파마’로 통용되는 뽀글거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장한 순박한 모습은 다소 튀어보였다. ‘지방대 출신’에 겉치레를 모르는 ‘김 대리’를 표현하는 데엔 안성맞춤인 장치였는지도 모른다.

“일 하는 데에 있어선 스스로를 수없이 채찍질할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김대명의 해석이 시청자에겐 ‘옆자리 동료’처럼 다가왔다. 드라마 촬영장소였던 서울스퀘어 지하의 카페에선 김대명에게 3500원 짜리 커피를 2800원에 팔았다. “직원 할인 해드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고 나왔다”는 김대명도 내심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싶었다. ‘진짜 직장인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김대명이 연기한 김 대리에게서 가장 많이 들렸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함이 아닌 그 안에서 조금의 온도차가 있는 인물”을 원했던 김원석 감독의 눈에 든 김대명은 ‘선물’처럼 다가온 ‘생활인의 삶’을 꼭 한 번 살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녹여내는 절제된 감정, 그 수많은 아득한 날들을 연기해보고 싶어 5수 끝에 대학에 입학하던 때처럼 그는 “땅바닥에 발 붙이고 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꿈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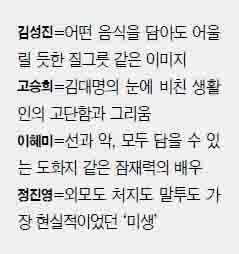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방황하는 칼날)였고, 테러범(더 테러 라이브)이었고, 역모에 가담하는 자객(역린)으로 살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온 김대명에게 “상상의 여지가 필요치 않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직장인의 세계”를 전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말투, 옷차림, 걸음걸이, 술자리….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쉽게 걸리겠다 싶었죠.” 전화를 받을 때 나타나는 미묘한 톤의 차이, 상사나 동기ㆍ후배를 부르는 호칭부터 드라마 내내 차고 넘쳤던 어려운 무역용어까지 김대명은 놓치지 않고 연구했다. 직장인 친구들과 상사맨을 통해 얻은 정보는 김 대리의 디테일을 완성한 일등공신이었다.
드라마 안에서 ‘생활인’이었던 김대명은 사실 ‘시인’을 꿈꿨다. “많은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함축해 던질 수 있는 것이 좋았다”는 김대명에게 시인 이상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의 고교시절을 함께 보낸 외로움의 동지였다. 고단한 일과를 반복하는 생활인을 살아냈던 김 대리가 현실의 김대명으로 돌아오자 서정적인 감성이 묻어났다. 좋아하는 작가는 ‘철도원’을 쓴 아사다 지로이고, 좋아하는 뮤지션은 김광석과 유재하, 그리고 들국화다. 여유가 생길 땐 서촌을 거닐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군산에 들러 미묘한 풍광의 변화를 빼곡히 채워오곤 한다.
“혹자들은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꿈을 꿨냐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보면 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기 역시 많은 이야기를 작게 뭉쳐 던지는 건데 다만 표현방식이 다를 뿐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냉정해지는 것”이 자신의 연기지론이라는 김대명은 “지금 만족시켜주는 연기를 못 하면 다음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도 익히 알고 있다. 천천히 쌓아올린 공든 탑은 ‘미생’으로 빛을 발했다. 광고계의 블루칩이 됐고, 차기작으론 영화 세 편(내부자들, 뷰티 인사이드, 판도라)이 기다리고 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두 달이나 가겠나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건 일단 작품이 좋았고, 스태프가 치열했던 덕분이에요. 김대명이라는 배우를 처음 봤다는 낯설음이 후한 점수를 줬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본게임이죠. 두려움이 더 커요.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려고요. 취해있지 않으려 정신줄을 부여잡고 있어요.”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