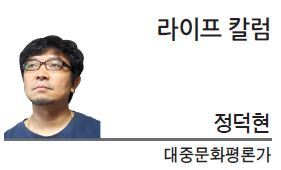 박유천 사태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늘 바른 이미지의 소유자로 여겨져 왔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폭행 혐의’나 ‘유흥업소’ 심지어 ‘화장실’이라는 단어들은 거꾸로 그에 대한 대중적 실망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물론 잘못된 처신에 대한 비판은 박유천 스스로도 달게 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성폭행’인가 아닌가 하는 그 경찰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지 그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유천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고, 나아가 심지어는 “이제 회생 불가능”이라는 결론까지 내려졌다.
박유천 사태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늘 바른 이미지의 소유자로 여겨져 왔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폭행 혐의’나 ‘유흥업소’ 심지어 ‘화장실’이라는 단어들은 거꾸로 그에 대한 대중적 실망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물론 잘못된 처신에 대한 비판은 박유천 스스로도 달게 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성폭행’인가 아닌가 하는 그 경찰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지 그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유천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고, 나아가 심지어는 “이제 회생 불가능”이라는 결론까지 내려졌다.
이 사안은 뭉뚱그려보면 모든 게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 사안 하나하나를 낱낱이 떼어서 보면 과연 이게 전체를 싸잡아 매도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즉 성폭행인가 아니면 성관계인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즉 성폭행이라면 범죄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지만 성관계라면 성인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연예인이라고 도덕군자일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이건 사생활이 아닌가.
첫 번째 고소에 이어 네 번째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연달아 터져 나온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그것이 ‘성폭행’의 증거라면 매도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취향’의 문제나 혹은 나아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면 다른 이야기다. 만일 이렇게 반복된 정황들이 성폭행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그것은 치료의 대상으로서 동정되어야 할 일이지 매도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용서에 인색하다. 심지어 이렇게 쓰는 글조차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은 면죄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박유천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번 잘못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다. 게다가 그 잘못이 범죄가 아닌 ‘투명사회’가 요구하는 투명한 사생활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무수히 많은 연예인들이 바로 이 도덕과 윤리의 도마 위에 올라가 곤욕을 치렀다. 조영남씨는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고, 유상무는 성폭행 혐의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AOA의 설현과 지민은 ‘역사 무지 논란’을 겪었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때는 자숙을 이야기했지만 최근 들어 ‘회생불능’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
사회적 분노는 연예인 사건들에 대해 용서 없는 끝장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한 번 실수가 그 인생을 끝장내는 흐름에 대중들이 노출되고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내재화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려면 통상적인 자숙과 복귀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재활 시 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연예계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한 방에 끝장내는 사회에서 미래를 찾긴 어려울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