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군사, 외교적인 사안이지만 대중문화 분야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셈이다. 대중문화란 감정산업, 애정산업이어서 법과 제도보다 앞서 심정만으로도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있다.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 아니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을 가진 스타와 콘텐츠는 존재하기 어렵다.
4년전인 2012년 일본에서도 한류가 갑자기 위축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보수우익과 연관된 반한류 기류에 의해서다.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이나 한국스타의 방송출연이 거의 사라졌지만 팬덤이 있는 FT아일랜드, 동방신기, 엑소, 방탄소년단 등의 일본 공연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한번 경색되기 시작하면 아예 한국 스타와 관계자의 중국 입국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내수시장만으로는 어렵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 등 반한류 기류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일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제로 상태에 다다랐다.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등으로 때마침 열려준 중국 한류로 숨통이 트였지만, 또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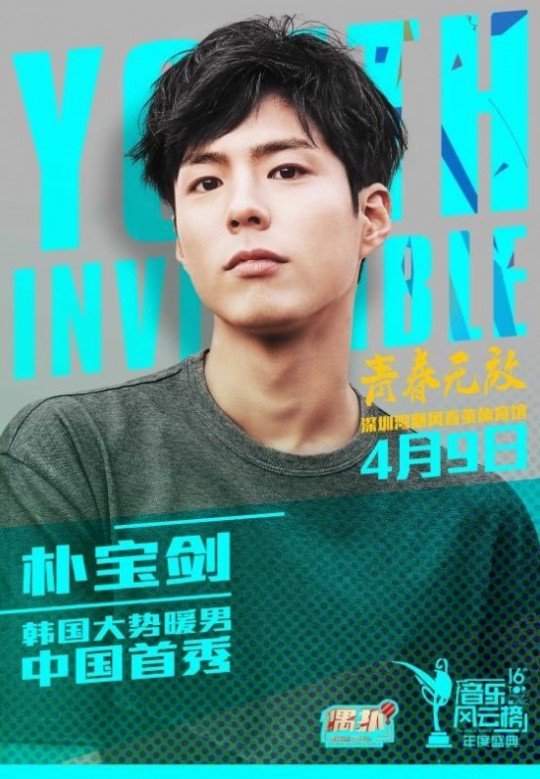
여기서 풀어야 할 과제는 우선 양국이 문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다. ‘태양의 후예’이후 중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 콘텐츠, 한중 양국에서 동시 방송되는 드라마, 한국 콘텐츠의 중국판 제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업은 미룰 수 없다.
2005년 영화 ‘외출’ 기자회견장에서 배용준에게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땅인지 질문하는 사례를 경험했다. 송중기에게 사드를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된다. 한류 스타는 문화 교류를 위해 그 곳을 찾는 것이지, 정치나 외교 업무를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국민감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항시 가변적일 수 있는 한류 상황에 대비해 평소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도 한류 다변화 전략도 강구할 때다.
/w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