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의 ‘좋니’는 한마디로 무(無)트렌드가 트렌드를 이긴 사례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월간 윤종신‘과 ‘리슨’ 등으로 대표되는 윤종신의 꾸준함이 합쳐진 결과다.
댓글에서 봤다. “결국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만 발전할 뿐.” 이 말을 조금 달리 풀면, ‘대중이 좋아하는 내용물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포장지가 바뀔 뿐’ 정도로 해석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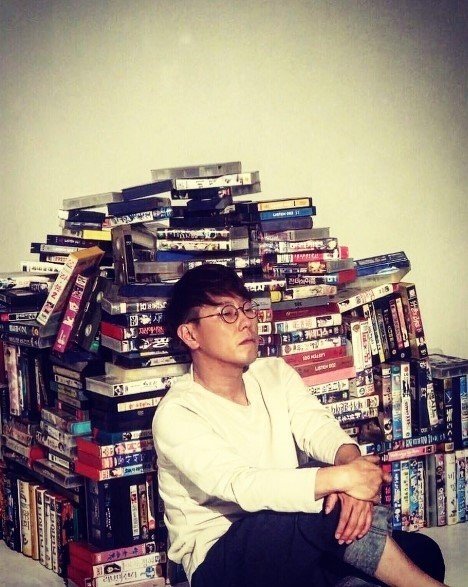
윤종신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악에 대해 말하면서 트렌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잘 만든 음악과 못만든 음악이 있다고 했다. 복고를 현재화 하는 방식과 전략도 트렌드에 따라서 시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빈티지’라고 표현했다.
‘좋니’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 윤종신 발라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요즘 감성의 MSG가 전무하다. 트렌드가 없는 것 같다. ‘좋니’ 가사는 헤어진 여성에 대해 느끼는 남자의 힘든 심정을 전하는 편지 같아 공감대를 높여준다.
윤종신은 사랑이 완전히 안이뤄지거나 이별후의 솔직하고 찌질하기까지 한 심리 묘사가 세세하다. 정통 발라드 가사의 관점에서 볼때 약간 삐딱선을 타는 느낌도 들지만 나는 윤종신의 가사가 더 솔직하고 인간적이라고 느껴진다. 안그런 척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 편하게 보내주기 힘든 찌질함도 언뜻 드러난다.
윤종신은 헤어진 자, 실연자, 연애의 패배자가 겪는 아픔을 미화하지 않는다. ‘찬란한 슬픔’으로 승화시키지도 않는다. 사랑했던 여성과 헤어지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좋은 소리만 나올 리 없다. 그 상황의 언어를 제시하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힘듦을 드러내는 감성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좋니’는 가사로만 보면 윤종신이 쓰왔던 뒤끝 노래의 정서와 맥을 잇고있다. ‘혹시 완벽한 그대의 유일한 흠이 내가 될까 그래요. 그대여’의 ‘Miss. perfect’와 ‘떠나간 너의 행복 빌어줄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속 깊은 사랑 내겐 없으니/우리의 사랑 메말라 갈라질 때까지 다 쓰고 가’의 ‘말꼬리’에서 보여주는 윤종신의 과거 심리와 닿아있다.
‘좋니’는 제목부터 살짝 뒤끝이다. “아프다 행복해줘”에도 뒤끝 정서는 약간 남아있다. ‘니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진짜 조금 내 십 분의 일 만이라도’와 ‘난 딱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스쳤던 그저 그런 사랑’ 등 곳곳에 아쉬움이 묻어있다.
하지만 ‘좋니’는 뒤끝에 방점이 찍혀있는 노래가 아니다. ‘힘들다’에 방점이 찍혀있다. 왜 힘드냐고? 널 심하게 사랑했으니까다. 그러니 ‘좋니’는 뒤끝노래가 아니다. 가사에서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니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정도만 봐도 이 점은 쉽게 드러난다.
대중문화란 장르나 스타일, 스토리텔링 등에서 하나의 히트 방식이 나오면 그것이 물이 빠질 때까지 써먹는(그게 트렌드다) 것이다. 괜히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다가는 리스크가 커져 외면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트렌드를 즐겨 찾게된다.
하지만 無트렌드가 트렌드를 이길 때도 있는 법이다. 자극과 극대화로 치닿는 MSG의 시대에는 저자극의 無트렌드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더 윤종신이 시대를 초월하는 발라드를 쓰는 작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게 된다.












